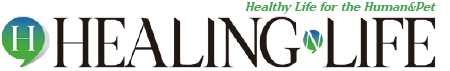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상태' 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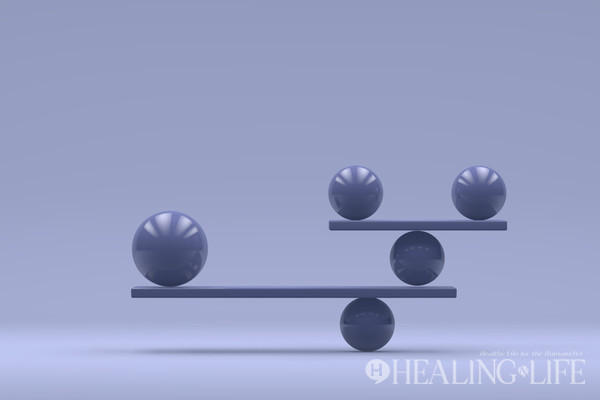
나는 참 잘 챙겨온다.
치킨이나 먹태 등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포장해서 가지고 온다. 지인들은 이런 나를 잘 알아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준다.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보면, 무언가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고 온다. 쇼핑백이나 그 밖에 나에게 영감(?)을 주는 물건은 죄다 들고 집으로 가져온다. 어딘가에 놓여있다가 우연히 발견한 물건을 보면, 그걸 가지고 왔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한다. 아마 집구석 어딘가에,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에 물건이 먼지를 맞으며 그렇게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잘 버리지 못한다.
혹시 어디에 쓰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택배 상자 중에 크기가 아담한 상자를 보면, 그냥 버리지 못한다. 구하기 딱 애매한 크기라 그런다. 그만한 상장가 없어서 한참을 찾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잘 때서 한쪽에 고이 보관해둔다. 책을 주문하면 포장돼 오는 포장지도 그렇다. 대체로 주황색 겉면에 쿠션감이 있는 포장지도, 어딘가에 쓰일 거라는 확신을 불러온다. 그렇게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예상처럼 시의적절하게 사용된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사용하는 횟수보다 쌓이는 개수가 더 많다.
어제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쇼핑백과 비닐봉지를 세 뭉텅이나 버렸다.
너무 쌓아두었더니 차지하는 부피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동하는 통로를 가릴 만큼. 그래서 과감하게(?) 버렸다. 이런 크기는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 쇼핑백은, 잘 사용할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쌓아만 두었다가 버려지는 쇼핑백이 꽤 됐다. 쇼핑백을 버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건 쇼핑백이 아니라, 욕심이지 않을까?’ 쇼핑백 말고도 버려야 할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어딘가에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절약 아니면 활용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기특(?) 해하며 하나둘씩 가져왔고 쌓아왔다. 하지만 그 양이 과하면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 이상으로 취하면 말이다. 과식해도 그렇다. 필요한 만큼 적당히 먹으면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다. 하지만 더 먹고 싶은 마음에 하나둘 더 먹게 되면, 심한 포만감에 힘들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다. “왜요?”라며,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짓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이다.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 말고, 적당한 정도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상태라 생각된다. 많이도 아니고 한둘만 넘어가도 ‘과(過)’가 되기 때문이다.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숟가락을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음식이 들어간다고 바로 포만감을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먹는 도중에 포만감을 느끼면 이미 넘친 게 된다. 경험상 그렇다.
적당한 상태는 조금 모자란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아직 배가 부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찼다는 생각이 들면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적당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잘 안돼서 문제긴 하지만 말이다. 중용을 연습해야겠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당한 상태까지 취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감정도 연습해야 하듯, 중용도 연습해야 익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용의 상태가 넘치는 상태보다 행복한 마음이 든다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관련기사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0. 혼자만의 시간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19. 당신의 숨 쉴 구멍은 무엇인가요?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18. 지금의 길은, 선택받은 길이다.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17. 희망을 희망하는 삶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16. 의심하지 말고 나의 루틴을 믿어라!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15. 중심 잡힌 삶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1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짐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13.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12. 내가 원하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을 청하며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11. 징크스를 디딤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10.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9. 개인이 조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8.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나요?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7. 자신을 잘 보고 있나요?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6. 내적 성장에 필요한 인내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5. 듣고 행동할 의지가 있나요?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4.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3. 자신의 배경을,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1.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나요?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2.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 날까지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3. 자신에게 당당한, 선택이 필요한 때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4.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5. 무엇이 나를 믿게 하는가?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6. 무엇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7. 꾸준함으로 만드는 기적 이상의 표징(表徵)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8. 꿈의 해석은 자기 생각과 의지가 결정한다.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29.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 소신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30.우리 공동체의 구심점은 무엇인가요?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31.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하게 하고 있는가?
- [김작가의 완벽한 하루] 32. 선순환의 출발점에 서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