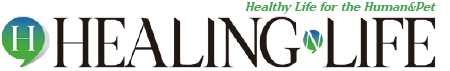한국의 진해와 같은 해군 도시, 영국 남부 포츠머스로의 출장 그리고 런던에서의 며칠 머물기로 대영제국의 매력에 빠져보자.
생각보다는 심심한 도시 그러나 그들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신사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탈리아 베니스를 출발한 비행기는 런던 남부 근교의 게트웍(Gatwick Airport) 공항에 도착한다.
생소한 공항이름과 같은 EU 국가에서 왔음에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입국절차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영국을 갈 때는 주로 히드로(Heathrow) 공항을 이용하였는데, 이번 출장길은 켄우드 본사가 위치한 포츠머스로 향하기 때문에 출장지와 가까운 게트웍 공항으로 입국을 한다. 입국 절차를 진행할 때, 방문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는 입국 심사관의 억양도 익숙치 않고 상대적으로 무뚝뚝한 느낌이다. 일행과 함께 미리 준비되어 있는 버스를 타고 포츠머스에 위치한 호텔로 향한다.

포츠머스는 말그대로 항구를 뜻하는 Port와 입구를 뜻하는 Mouth가 합쳐진 지명인데, 영국 남부 햄프셔주에 위치해 있다. 중세에 리처드 1세가 영국 해군의 군항을 건설한 후로 영국의 해군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다.
호텔에서 나와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를 불러 탔는데, 요금이 만만치 않다. 왠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호텔의 위치와 처음 온 도시의 어색함을 감안할 때, 장거리를 걷는다는 것도 부담이기는 하다.
간단한 식사를 하고 돌아온 호텔은 적막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너무 조용하다. 수영복을 챙겨 수영장을 가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내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름 괜찮은 호텔이다. 차라리 여행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맥주나 괜찮은 와인 한잔을 들고 명상에 빠지고 싶은 생각을 잠시하다가 내일부터 있을 촘촘한 교육 및 미팅 일정 소화를 위하여 이른 시간 잠자리에 들기로 한다.
다음날 일행들과 도착한 켄우드 본사는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규모의 빌딩이다. 간단한 회사 소개를 받고 조를 나누어 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주로 제품교육이다. 가정용 조리도구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에서는 업소용, 유럽에서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제품들도 있다. 식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 여기서 만난 트레이너, Caroline ‘Mussell’ Watson이라는 친구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훤칠한 키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로 제품 교육을 담당하는 친구인데, 후에 같은 회사 직원과 결혼을 했고 지금은 홍콩에서 근무 중이다.
제품 교육은 주로 실습을 병행한다. 덕분에 평생 처음 유럽식 요리를 해보는 경험도 했다. 나쵸를 찍어 먹는 소스도 만들어 보고, 생면 파스타, 피자도우 등을 만들고 실제 파스타와 피자를 만들어 나누기도 했다. 집에서도 이렇게 요리를 하면 가족 간에 정이 깊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 제품 샘플 몇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밀가루와 기타 식재료로 온통 어지러진 좁은 주방 그리고 피자도우나 파스타면을 잔뜩 만들고는 얼마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오랬 도록 방치한 후 버리기를 두어 번 하다가 결국은 의욕 넘치는 가장의 한두 번 해프닝으로 끝났다.

같이 온 일행과 본사 직원들은 교육을 마치면 시내로 향하여 포츠머스를 구경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곤 했는데, 영국은 정말 고유의 음식이라고는 피쉬앤칩 그리고 어느 나라나 있는 스테이크 정도 외에는 특별한 메뉴가 없다.
영국을 왔으니 피쉬앤칩에 맥주를 곁들이는 정도. 건워프부두 스피니커 타워(Gunwharf Quays, Spinnaker Tower)도 구경하고 주변 산책도 하면서 장난스러운 사진을 남기기도 한다. 스피니커타워는 포츠머스의 해양역사를 상징하는 돛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사진이 더 잘나온다. 과거 이곳은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는 창고였다고 하는데, 1996년에 포츠머스 시의회는 무기고를 닫고, 이 곳을 레스토랑, 펍, 영화관과 작은 아울렛이 있는 복합 주거 공간으로 개발했다고 한다.
작고 조용한 항구 도시, 포츠머스는 도시의 복잡함이 없어 좋다. 영국을 여행한다면 런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므로 한번 정도 일정에 넣어 방문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일정을 마치고 기차역으로 향한다. 기차는 조용한 풍경을 헤치고 런던으로 향한다. 1시간 40분 정도를 달린 열차는 런던 워털루역에 도착하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한다. 도착해서 보니 사실 호텔이라기 보다는 좀 오래된 모텔 같은 호텔이다. 건물을 허물지 않고 옛 것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유럽의 특성상 오래된 건물이 많다.
영화에서나 보던 수동 문을 닫으면 움직이는 엘리베이트도 타본다. 자그마한 방에 짐을 풀고는 무엇을 할까 지도를 뒤적인다. 홍콩에 있는 상사가 영국 출장을 가는 길에 백화점이나 할인점 몇 곳을 둘러서 시장 파악도 하면 좋겠다는 조언에 따라 며칠 머물기로 한 것이다. 런던 시내를 들여다보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출장지의 허브 공항정도로 히드로 공항만 몇 번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말이니 일정에 있어 부담이 덜하다.
우선은 런던 서쪽에 위치한 사우스 뱅크 쪽으로 가보기로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전 관람차, 135m 높이까지 올라가는 런던 아이(British Airways London Eye)를 타고 시내를 둘러본다. 캐빈(Cabin)이 넓어 20명 이상이 탈 수 있는데, 우연히 만난 한국 중년 부부는 여행차 왔다고 한다.
영국을 구경하고 유럽 다른 나라들도 둘러보는 제법 긴 여행이란다. 내심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가 작가도 여정 없는 긴 유럽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 사실 몇 년전부터 지인들과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하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런던까지 캠핑카를 타고 기한 없는 여행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하고 있기는 하다. 작가는 기획을 하고, 누구는 운전을 하고 누구는 자금을 좀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식이다.
처음에는 그냥 던지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가 만남이 계속되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뚜렷해지는 느낌이다. 조금씩 현실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런던아이 투어를 마치고 다리를 건너 런던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빅밴을 배경으로 몇 장의 기념사진을 남기고 템즈강을 따라 좀 걷기로 한다. 거대한 돔을 씌운 르네상스 양식의 런던을 대표하는 성당인 세인트폴 성당을 보고 걷다 보니 런던의 상징으로 불리는 타워 브리지(Tower Bridge)를 만난다.
1850년부터 계획을 세웠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1886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8년만에 완공한 다리다. 화물선이 지날 때는 83도까지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폐교 형식으로 낮시간대 보다는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야경이 더 좋다는 생각이다.

제법 걸으면서 런던 시민들의 삶도 살짝 들여다보고 유명하다는 몇 곳 관광지를 돌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린다.
내일의 일정을 위하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시장 조사겸 소매점들을 좀 둘러보려면 내일도 꽤나 걸어야 할 것이다. 여기 영국의 택시비는 차라리 좀 걷고 맛있는 것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나을 만큼 끔찍히 비싸다.
관련기사
- [출장과 여행] 26. 비즈니스와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_베니스, 무라노섬과 부라노섬
- [출장과 여행] 25. 비즈니스와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_베토벤 생가(Beethoven’s House)
- [출장과 여행] 24. 비즈니스와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 '독일 쾰른 출장'
- [출장과 여행] 23. 중국 상하이 Nanxiang Old Town 몇 백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여행지 ‘Guyi Garden’
- [출장과 여행] 22. 상하이 올드타운(Jiading Zhouqiao Old Street)
- [출장과 여행] 21.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상징하는 건축물 ‘프라하 성과 소지구’
- [출장과 여행] 20. 세계 문화 유산의 도시,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밤’
- [출장과 여행] 19. 세계 문화 유산의 도시, 체코의 수도 ‘프라하’
- [출장과 여행] 18. 알프스 산맥 국경지역,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 ‘꼬모’
- [출장과 여행] 17.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베로나
- [출장과 여행] 1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안네 프랑크하우스·반고프 박물관 방문기
- [출장과 여행] 15. 풍차로 유명한 네덜란드 전통도시 잔제스칸스(Zaanse Schans)에서 전통 문화 엿보기
- [출장과 여행] 14.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규모의 도시 암스테르담에서 하룻밤
- [출장과 여행] 13. 시간이 멈춘 듯한 중세도시, 트레비소(Treviso)의 진주라 불리는 아솔로(Asolo)를 가다
- [출장과 여행] 12. 파리의 야경투어
- [출장과 여행] 11. 여행 가고 싶은 도시 1위, 프랑스 파리!
- 출장과 여행 - 10. 붉은 벽돌건물이 특징인 도시, 영국 맨체스터
- 출장과 여행 - 9. 프랑크푸르트에서 50분, 동화 같은 도시 ‘하이델베르크’
- 출장과 여행 - 8. 비즈니스와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 '이탈리아 트레비소(Treviso)'
- 출장과 여행 - 1. 싱가폴
- 출장과 여행 - 2. 북유럽을 느끼기 충분한 '핀란드 헬싱키'
- 출장과 여행 - 3. 낮과 밤의 문화가 다른 '홍콩'
- 출장과 여행 - 6. 현대와 과거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공존 '마카오'
- 출장과 여행 - 7. 이태리
- 출장과 여행 - 4.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뮌헨'
- 출장과 여행 - 5. 순수하고 친근한 느낌이 가득한 '독일'
- [출장과 여행] 28. 줄리아 로버트와 휴 그랜트의 사랑이 있는 도시, 노팅힐을 가다
- [출장과 여행] 29. 대영제국 제1의 도시, 런던에서의 며칠
- [출장과 여행] 30. 중국 상하이 그랜드하이얏트 호텔에서 열린 회사 글로벌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