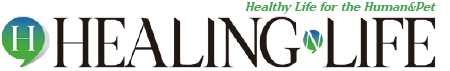박지성 선수로 익숙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연고지, 영국 맨체스터!
런던에 이어 영국 제2의 도시로 부상하는 Manchester로 떠나는 출장
그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빨간 벽돌로 상징되는 건물들을 따라 그들의 삶을 이해해 보자
이번 출장은 한국에 지사를 다시 설립하는 과정에서 영국팀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배우고 이를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하는 것이 목적이다.
암스테르담을 거쳐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 늦었다. 상하이에서 온 친구 그리고 독일 본사에서 온 친구와 what’s app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항 주차장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한다. 독일 본사에서 온 친구와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데, 당시 영국에 파견 근무 중이라서 독일에서 주말을 보내고, 필자 일행을 픽업하기 위하여 약 1,300km를 차로 달려 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차를 운전하여 이동한다고는 상상도하기 힘든 거리. 역시 아우토반을 가진 독일인들의 이동 방식인가 싶다.
늦은 호텔 체크인 후 간단한 맥주 타임을 갖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영국팀의 사무실을 잠시 방문하고 몇몇 소매점을 방문하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에 영국팀 긴급 일정 발생으로 몇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 상하이에서 온 친구의 제안으로 시내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에 다시 합류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맨체스터 시내를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상하이에서 온 친구는 맨체스터를 잘 아는 듯 여기저기를 돌아보자고 제안을 해서 흔쾌히 동행을 하였다.

2월임에도 불구하고 봄꽃이 피어 있는 이곳 맨체스터의 기후를 보니, 영국과 아일랜드 주변을 흐르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0도~20도 내외)로 따뜻한 여름과 시원한 겨울정도의 날씨라고 한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다. 시내를 따라 걷다 기념품점도 들러보고, 빨간 벽돌로 상징되는 맨체스터의 건물들을 따라 걸으며 시간을 보낸다.
맨체스터의 건물들은 빅토리아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스타일로 지어져 있다. 광범위하게 사용된 붉은 벽돌이 도시의 특징이 되었는데, 목화 무역이 한창이던 때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 공원을 걷다가 쉬기도 하고, 길을 걷다 스타벅스에서 잠시 쉬어 보기도 한다.

한국과는 8시간정도 시차가 나는 곳이고, 영국식 영어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데, 햇볕을 받으며 적당히 피곤할 만큼 걸어주면 쉽게 숙면에 들고, 다음날 Jet Lag가 덜하다. 대체로 따뜻하고 연중 평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이번 방문기간에는 다행히 맑은 하늘을 내어 준다.
영국 총괄 매니저는 전원주택 같은 곳에 산다. 집안에서 동물을 키우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BMW 135 차를 시원하게 운전해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 “이래서 BMW를 타는 구나”를 확실히 느끼게 달려주었던 것 같다.

독일 본사에서 온 친구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전화 연결이 어려운 곳에 산다. 조용한 삶이 좋단다. 다만 골프장 근처라서 골프공이 가끔 마당으로 날아든다고 한다. 일행은 여정의 하루를 이 친구 집에서 미팅을 진행 하였는데, 정말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소음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조용한 시골의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골프장 뒤편에 위치한 마당 넓은 집이다. 바비큐 그릴을 꺼내면 캠핑을 온 듯 착각할 정도의 그런 집이다.
영국도 지역에 따라 샌드위치를 파는 이동용 푸드트럭 같은 것이 오기도 하고,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간이식당들이 있다. 우리처럼 찌게를 끓이고 반찬을 내어주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주방만으로 서빙이 가능하다. 유럽 나라 중에서 영국은 음식에는 큰 매력이 없다.

맨체스터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피쉬앤칩 집을 가보아도 신선한 생선을 잘 튀겼네 정도.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서 하나가 피쉬앤칩인데, 필자의 눈에는 맥주 한잔 곁들이는 사이드 메뉴 정도 느낌이다. “World Famous Fish & Chips”라는 브랜드의 이집은 맨체스터의 상당히 유명한 맛집이라고 한다. 현지인들은 우리가 김치찌개 맛집을 찾듯이 이곳 피쉬앤칩스를 먹기 위해 줄을 선다. 가게에는 오로지 FISH & CHIPS만 판다. Take-out도 가능하다. 우리 일행은 Take-out하여 사무실에서 워킹런치로 먹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퇴근 후 포장마차나 선술집에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귀가를 하듯, 영국 사람들은 펍에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즐긴다. 직장과 집을 연결해주는 중간 구역 같은 느낌이다. 우리처럼 과하게 먹지는 않는다. 다만 적당한 양의 맥주를 간단한 안주거리(대부분 비스킷정도)와 함께 한 두잔 마시고 귀가를 한다. 물론 친구를 만나거나 비즈니스 미팅이 있으며, 스테이크나 파스타에 와인을 곁들이거나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있는 장소를 사전 예약하고 격식에 갖추어 시간을 즐기기도 한다.
이번에 모인 팀들은 나이대도 그렇고 생각들이 캐쥬얼하기때문에 굳이 격식을 갖추는 것보다 편하게 친해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도시를 산책하며 받는 느낌은 대부분의 유럽 도시가 그러하듯 오래된 건축물들을 잘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현대의 느낌을 잘 접목하여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첫날은 중국계 영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절묘하게 연결해 둔 퓨전식을 먹고, 둘째 날은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 London Pride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생맥주가 있다는 것 외에 음식 자체가 주는 특이함은 찾지 못하였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동료들과 현지인들. 몇 잔의 생맥주와 함께 낯선 도시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간다.
유럽을 출장가거나 여행을 하면 늘 부러운 것이 여유다. 우리처럼 매일 매일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산다기 보다 자신들의 가치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즐기며 산다는 것이다. 미팅 중에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토론하기도 하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정도로 격하게 미팅을 진행하지만, 미팅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맥주잔을 서로에게 기울인다. 안부를 묻고 뭘 더 도와줘야 할지를 묻는다.
퇴근 시간이 되면, 회사와 개인의 일은 철저히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다. 이것에 대한 대충이라는 것은 없어보인다.
하늘이 내어준 맑은 하늘 덕분에 일정 소화에 큰 무리가 없었고, 아침잠을 좀 아껴 둘러본 공원에는 또 다른 해가 떠오른다. 호텔로 돌아가 짐을 꾸리고, 간단한 유럽식 조식을 먹고 공항으로 향할 시간이다. 긴긴 여행이 기다린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고 했다. 그 과정 역시도 또 다른 여행이 되도록 그 여정이 삶과 잘 맞닿을 수 있도록 힘찬 아침을 열며 이번 출장을 마무리 해 본다.

관련기사
- [출장과 여행] 24. 비즈니스와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 '독일 쾰른 출장'
- [출장과 여행] 25. 비즈니스와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_베토벤 생가(Beethoven’s House)
- [출장과 여행] 26. 비즈니스와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_베니스, 무라노섬과 부라노섬
- [출장과 여행] 27. 영국 포츠머스를 넘어 런던으로
- [출장과 여행] 28. 줄리아 로버트와 휴 그랜트의 사랑이 있는 도시, 노팅힐을 가다
- [출장과 여행] 29. 대영제국 제1의 도시, 런던에서의 며칠
- [출장과 여행] 30. 중국 상하이 그랜드하이얏트 호텔에서 열린 회사 글로벌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