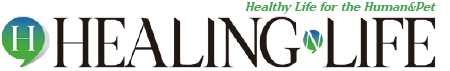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최종욱수의사 ㅣ 대수회 동물칼럼니스트
[ 대한수의사회 제공, 힐링앤라이프 편집]
의식주는 생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다.

의(衣)라는 것은 단순히 한문 풀이만 하면 옷이지만 동물들에게 옷은 곧 털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털과 깃털, 비늘, 두꺼운 가죽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난 인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들은 자연스레 의를 갖추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동물들은 모두 똑같은 단벌 하나로 지내니 사람처럼 유행을 탈 필요는 없겠지만 사계절마다 제때제때 털 옷을 잘 갈아입어야 또한 살아나갈 수 있다. 여름에는 가볍게, 겨울에는 두껍게 털옷을 갈아입는다.
주(住)는 인간이 동굴 속에서 나온 이후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갈구해야 하는 생존의 필수품이자 욕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물들의 경우 말 그대로 하늘이 지붕이고 땅(물)이 활동 공간이자 쉴 곳이다. 즉 돌아다니다 멈춘 곳이 바로 그날의 잠자리가 된다. 일부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이들은 나뭇가지로 잠자리를 만들기도 한다는 데 그렇다고 다른 동물과 차별화될 만큼은 아니다.

비버 같은 녀석들도 열심히 거대한(?) 집을 짓기도 하지만 홍수에 떠내려갔다 해서 결코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운명이거니 하고 다시 열심히 새 집을 짓는다. 사자가 사냥하듯 비버도 집 짓는 자체가 곧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더 힘 있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러나라 하면 또 미련없이 내 주어야 한다. 새들은 자신들이 살려고 집을 짓지 않는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동료들과 아무 곳이나 몰려다니다가 어스름 녘 찾아가는 가까운 나무가 그들의 잠자리이다.
소위 집이라 부르는 둥지는 오직 새끼를 키울 때만 사용한다. 까치는 둥지 짓는데 두 달, 그곳에서 새끼 기르는데, 한 달을 공들이지만 새끼가 날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그 멋진 둥지를 버려 버린다.
동물들은 식(食)에 대해서만큼은 의나 주보다는 훨씬 어려움에 봉착한다.
의. 식. 주란 인간의 기준에서 본 나열식이지만 동물들의 기준에서는 식이 가장 위에 있고 주와 의가 그 뒤를 따른다. 다른 것에 비해 먹거리만큼은 아주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이라고 불린다.
야생동물들의 삶은 먹을 걸 찾아서 옮겨 다니고, 도망치고, 쫓고 쫓기는 데 로망이다. 조금은 비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건 결과만 보아서 그렇지 이런 삶 속에도 희로애락이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이다. 야생에서는 굶주림과 더불어 움직임을 제한하는 배부름 또한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부른 사자는 옆에 철모르는 새끼 영양이 와서 건드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동물원 동물들의 경우는 이 중요한 먹거리로부터 해방된다.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일정량의 먹이가 주어진다. 그래서 종종 야생에서 보다 더 오래 살기도 한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도 부자가 더 오래 산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삶의 질인데 인간으로 치면 수형자들의 생활과 다름없는 이런 자유가 억압된 생활에서 과연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학자는 동물들이 한자리를 계속 맴돌거나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자기가 토한 걸 다시 집어먹는 등의 예를 들면서 이런 이상행동은 갇힌 스트레스에 의해 온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학자는 동물들의 감정은 사람과 달라서 이런 제한되고 편안한 환경이 오히려 더 만족감을 준다고 말한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동물들의 감정을 읽어낼 방법이 없는 한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단지 그들의 눈빛은 가련하게 보일 뿐이다.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복지 향상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 먹거리를 향상시키고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수명연장을 떠나서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이상행동, 그리고 불임, 집단 왕따, 카니발리즘(동종상해) 같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결국 집도 원하지 않고, 옷도 필요 없고 식량마저 저축하지 않는 진정한 자연의 집시인 동물을 가두어 키우는 자체가 분명히 동물들에게 무언가 커다란 것을 빼앗아버린 삶임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관련기사
- [동물원이야기] 6. 낙순이는 왜 꽉 안 물었을까?
- [동물원이야기] 5. 동물의 털
- [동물원이야기] 4. 수의사의 똥 사랑
- [동물원이야기] 3. 똥을 보는 동물들의 시각
- [동물원이야기] 2. 앵무새 길들이기
- [동물원이야기] 8. 토끼도 야생동물이다.
- [동물원이야기] 9. 사슴 뱃속에서 나온 것
- [동물원이야기] 10. 명상하는 동물들
- [동물원이야기] 11. 호랑이가 꾸짖다!
- [동물원이야기] 12. 동물원의 네버엔딩 스토리
- [동물원이야기] 13. 블랙스완과 검은 코끼리가 온다.
- [동물원이야기] 14. 동물원 정전사태
- [동물원이야기] 15. 개성 만점 꼬리감기원숭이들
- [동물원이야기] 16. 간단한 공존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