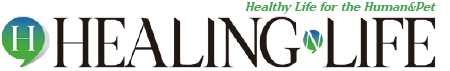최종욱수의사 ㅣ 대수회 동물칼럼니스트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자료제공ㅣ대한수의사회]

사람을 ‘벌거벗은 원숭이’라고도 한다.
사람도 전혀 털이 없는 건 아니지만 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사람이 털이 없게 된 것은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일 거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노출된 머리는 그래도 털다운 털이 아직도 남아 있다.
동물들도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털이 많아지고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털이 짧아지고 성겨져서 천산갑같이 아예 털 대신 비늘 장갑을 두른 녀석들도 있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변한 털들도 생겨났다.
동물들의 털을 넓게 구분하면 새의 깃털, 코끼리나 물범의 질긴 가죽, 뱀이나 도마뱀의 비늘, 개구리 같은 양서류의 점액질 피부 등도 동물 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털이 많으면 피부조직은 반대로 더 약하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사람의 샴푸로 목욕을 시키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
사람도 머리를 미용 목적으로 이용하듯 동물들도 털을 멋지게 치장용으로 이용하는 녀석들이 있다. 바로 사자의 목 갈기, 공작의 부채 깃털, 푸들 같은 개들의 멋진 곱실 털 등을 들 수 있다. 망토원숭이나 침팬지 수컷은 우두머리가 되면 특이하게 암컷과 그리고 다른 수컷들과 차별화된 털 색깔을 갖기도 한다. 주로 회색이나 흰색인데 특히 등 쪽에서 변이가 심해 이들을 따로 ‘화이트 백’이라 부르기도 한다. 화이트 백이 변이가 더 심해지면 아예 대머리가 된다.

털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숫 공작같이 번식기가 봄철인 경우는 여름부터 털갈이를 시작해 늦가을이 되면 화려한 공작 깃이 모두 빠져버리고 그와 동시에 다시 나기 시작해 이듬해 봄이면 절정을 이룬다. 겨울이 있는 곳에 사는 동물들도 여름털과 겨울털은 확연히 구분되며 여름의 막바지부터 겨울털로 변화하고 겨울의 중반부터 여름털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순환과정을 반복한다.
극의 동물들은 유난히 하얀 털이 많은데 이는 물론 보호색 역할이 주이지만 하얀색은 빛과 열을 털과 털 사이로 산란시켜 오히려 체온을 보존시키는 색이라는 이론이 있다. 반면 열대로 갈수록 털 색깔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것도 역시 온갖 색깔의 화려한 정글에 어울리는 보호색인지 아니면 환경에 따라 한껏 멋을 부린 것인지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동물들 중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털 손질 하는 데 보내는 이들이 많다. 특히 물새들의 경우 물에 닿기라도 했다 하면 물을 털어내고 부리로 기름칠하고 하는 작업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한다. 호랑이, 사자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도 온몸을 혀로 핥는 것이 취미로 여겨질 정도로 몸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나게 부지런하다. 개와 고양이의 대결에서 이 부분 만큼은 개가 분명 K.O. 패이다. 수달과의 동물들(해달, 수달)은 집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아주 좁고 길게 나 있어 아예 벽에 물을 털고 가게끔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있다.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털들도 있다.
사람의 콧속이나 귓속 털은 보온과 미생물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며 호랑이나 물개의 수염은 감각모라 해서 공기 중이나 물속의 미세한 진동들을 잡아내는 안테나 역할을 하여 야간에도 어두운 물속에서도 안 보고 사냥할 수 있게끔 해준다. 동물들의 털은 또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등장하면서 의복용으로 또는 장식용으로 엄청난 수난을 불러오기도 한 장본인이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호랑이나 표범들이 멸종해 버렸고, 악어나 비쿠냐 같은 동물들도 비슷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우리 사람은 충분히 식물이나 인조로 만든 천으로도 우리 몸을 가릴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동물에 대한 털 수탈은 없어야 한다. 동물원을 돌다가 쌍봉낙타와 라마의 목 부위에 겨울털이 벗겨져 나가고 단아한 여름털이 드러나는 걸 보았다.
이렇듯 작은 모근 세포 하나로 시작된 털 들도 낳고 자라고 죽고 하는 걸 지켜보고 작은 나의 몸 어디에선가도 분명 죽음과 삶이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하는 본연의 물음을 다시금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관련기사
- [동물원이야기] 4. 수의사의 똥 사랑
- [동물원이야기] 3. 똥을 보는 동물들의 시각
- [동물원이야기] 2. 앵무새 길들이기
- [동물원이야기] 1. 펭귄 수갑 제거
- [동물원이야기] 6. 낙순이는 왜 꽉 안 물었을까?
- [동물원이야기] 7. 동물들의 의식주란
- [동물원이야기] 8. 토끼도 야생동물이다.
- [동물원이야기] 9. 사슴 뱃속에서 나온 것
- [동물원이야기] 10. 명상하는 동물들
- [동물원이야기] 11. 호랑이가 꾸짖다!
- [동물원이야기] 12. 동물원의 네버엔딩 스토리
- [동물원이야기] 13. 블랙스완과 검은 코끼리가 온다.
- [동물원이야기] 14. 동물원 정전사태
- [동물원이야기] 15. 개성 만점 꼬리감기원숭이들
- [동물원이야기] 16. 간단한 공존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