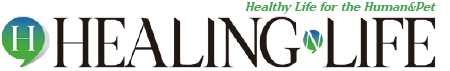박준양 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 교황청 국제신학위원)

1986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출신의 유다인 작가 엘리 위젤(Elie Wiesel, 1928-2016)은 그의 자전적 소설 <흑야(Night, 1958)>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갇혀 살면서 겪어야만 했던, 악몽과도 같은 고통의 체험을 이야기한다.
전쟁이란 극한 참상 속에 온갖 부조리와 불의가 횡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 조건 속에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기막힌 현실을 몸소 보고 겪게 되면서, 엘리 위젤은 자신의 깊었던 신앙심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는 죄 없는 이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우주만물의 영원한 주인이며 전지전능한 신께서는 왜 이러한 참상 속에서 그저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우 진지하게 질문한다. 그리고 왜 자신이 그러한 신에게 아직도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조롱 섞인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다.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선택하시어 밤낮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화장장에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하신, 우주의 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제단 위에서 학살되게 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흑야>, 허종렬 옮김, 가톨릭출판사, 1988, 83쪽)
특히, 한 어린 소년이 어른 두 명과 함께 사형집행을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충격적인 기억을 엘리 위젤은 절절히 고백한다. 두 어른은 교수대에서 금방 숨이 끊어졌지만, 어린 소년은 몸무게가 얼마 안 되어 가벼웠던 탓인지 반시간 이상이나 목에 밧줄이 감긴 그대로 매달린 채 버둥거리다가 서서히 비참하게 죽어갔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볼 때, 이를 강제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여러 사람들 중 어느 누군가가 혼잣말로 질문하였다. “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엘리 위젤은 바로 그때 자신의 내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회고한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81쪽)
이것은 바로 인간의 비극과 참상 속에서 제기되는, ‘신의 침묵’에 대한 물음의 절정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전능), 또한 어디든지 계시고(무소부재), 선(善) 자체이신(전선) 분이라고 고백되는, 신의 존재성을 묘사하는 전통적 표상 방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의문이다.
신은 왜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엄연히 자행되는 인류의 비극적 고통과 악의 구체적 현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저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가? 신은 잠자고 있는 것인가? 신은 혹시 출장이나 휴가 중에 있는가? 아니면 신은 매우 가학적이어서 인간의 고통과 비극을 보며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절망을 넘어서 체념과 조소 속에 제기되던 ‘신의 침묵’에 대한 질문이 끝내는 ‘신의 죽음’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고야 만다. 이처럼 인간의 비극을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는 인도주의적 무신론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신과 관련한 모든 추상적 진술이 여기에서 심각한 의문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너무도 끔찍한 악(惡)의 구체적 실재 앞에서 ‘악은 선(善)의 결핍’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철학적, 종교적 설명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가를 많은 이가 질문한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이론적 진술이 과연 어떤 호소력을 지니고 다가올 수 있겠느냐는 실존적 의문과 항의인 것이다.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죄 없는 의인들의 고통이 역사 안에서 계속 허락되는지 우리는 아직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욥기>의 저자가 그토록 처절하게 질문했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다.
<욥기>에서는,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악의 실재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방치하고 허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신’(incomprehensible God)에 대한 질문과 항의가 처절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온갖 재앙과 그로 인한 인간 고뇌 앞에서 마주하는 ‘신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큰 불가사의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질문은 아직도 계속된다. 많은 무고한 이들의 시련과 아픔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신이 존재한다면, 고통 받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필자는 몇 년 전 제주 올레 14코스를 홀로 걷다가, 제주도 서편에 위치한 한림읍 금능리 해변마을의 작은 골목길 어느 집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림(이윤영 작)을 본 적이 있다. 그림의 묘사와 더불어 거기에 적혀진 시가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한참 동안을 보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머물렀던 기억이 난다.
바다에서 뒤집혀진 큰 배와 그 오른쪽 옆에서 두 손 모아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려진 벽화에는, 제주도 한림이 고향인 것으로 알려진 고성기 시인의 시 <세월은 간다> 중 일부가 발췌되어 적혀 있었다. 그 시에는 작가 엘리 위젤이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겪어야만 했던 어둔 밤 그 심연의 체험을 떠올려 생각하게끔 하는 구절이 하나 있다.
“2014년 4월 16일
초침까지 멎은 아침
산 자는 모두 죄인 하늘 향해 두 손 모은
그러나
신은 없었다
무책임만 있었다
퍼렇게 봄날은 간다
빨갛게 동백은 진다”
관련기사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21. 마지막 나뭇잎을 떠나보낼 때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20. 청령포에서 상원사까지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19. 스파르타쿠스와 십자가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17. 생텍쥐페리와 함께 ‘인간의 대지’를 바라보며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18.‘아름다운 마음’을 기다리며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23. 치유함으로써 치유를 받다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24.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25. 상실의 아픔을 넘어선 ‘축복 춤’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26. 사랑하는 이를 위한 선택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27. 미켈란젤로의 창조 이야기: 어둠 속에 드러난 빛
- [박준양 교수의 인문학 산책] 28. 미켈란젤로의 창조 이야기: 시간과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