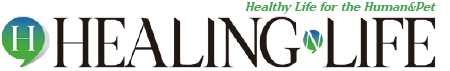1958년 대한민국 최초 여성 이발사 면허 취득…이덕훈 씨의 66년 이발 인생 담겨
운동선수에게는 루틴이라는 것이 있다. 징크스와 비슷한 것으로,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루틴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한다.
기자도 중요한 취재나 인터뷰를 앞두고 꼭 하는 루틴이 있다. 바로 머리를 자르고 면도하는 일이다.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취재원을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과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일종의 의식이다.
이런 중요한 의식을 내 저주받은 손에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자는 미용실보다는 이발소를 애용한다. 미용실에서는 면도가 되지 않는 까닭이다. 물론 일명 바버로 불리는 젊은 이발사들이 하는 바버샵도 있지만, 자주 이용하려면 호주머니가 넉넉해야 한다. 용돈 받고 사는 유부남에겐 무리가 있다. 역시 동네 이발소가 최고다.
하지만 지난달 10월 12일, 중요한 인터뷰를 하루 앞두고 집 근처 이발소가 갑작스레 휴무한 상황이다. 일요일에 하는 이용원을 찾는 일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다. 수소문 끝에 전설적인 이발사가 있다는 한 이용원을 찾았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새이용원’이다.

새이용원은 어느 동네에서나 한 개쯤 볼 수 있는 오래된 이용원의 모습이었다. 낡은 간판과 유리위에 덕지덕지 붙은 시트지, 딱 옛날 이용원 감성이다.
이용원 입구에서 연세 지긋한 할머니께서 사람 좋은 미소로 인사를 한다. 동네 할머니일까. 하지만 흰 가운을 입은 복장이 심상찮았다. 이분이 바로 전설적인 이발사, 대한민국 여성 최초 이발사 면허 보유자인 이덕훈 씨(85)다.
“내가 54년부터 가위를 잡기 시작했으니 벌써 66년 된 거야. 이걸로 돈 못 버는 남편 먹여 살리고 자식 세 놈 다 키웠어”

19세부터 어깨너머로 이발 기술을 배운 이 씨는 4년이 지난 1958년 23세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이발사가 됐다. 이 씨는 “명랑이발관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28개의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일했다”며 “여기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가위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66년의 세월이 담긴 가위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기자는 이용원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내부는 온통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70년대 이발소에 온 기분이랄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4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머리카락이 까치집이야. 빗이 안 들어가잖아”
이 씨의 가위질이 시작됐다. 가위와 함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잘려나갔다. 그는 “빗으로 머리를 빗었을 때 걸리는 것 없이 잘 빗어져야 좋은 머리”라며 “이렇게 솎아줘야 빗질이 잘 된다”고 말했다.
이 씨의 가위질은 거침없었다. 순식간에 머리를 솎아낸 뒤 보기 싫게 삐쭉 튀어나온 옆머리와 귀 뒤쪽 머리를 손질했다. 하지만 결코 뭉텅쿵텅 잘라내지는 않는다. 수천 번의 가위질, 조금씩 잘려나간 머리가 쌓이는 것이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뿐이다. 6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속도다.
가위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이 소리는 누구든지 잠들게 할 수 있는 마성의 소리다. 이발소에만 오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다. 최근 사람들이 잠이 안 올 때 ASMR(자율 감각 쾌감 반응) 영상을 보고 듣는다던데, 이발소의 가위 소리가 곧 ASMR이다. 잠깐 눈을 붙였더니 어느새 머리 손질이 끝났다.
이제는 면도의 차례다. 의자를 젖히고 누워 면도 크림을 바르고 면도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날 면도칼을 사용하는 다른 이발소와 달리 이 씨는 목욕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꺼내 들었다. 저 면도기로는 솜털까지 깔끔하게 면도가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이 씨의 거침없는 손길과 함께, 듬성듬성 보기 싫게 자랐던 수염이 사정없이 잘려나갔다. 얼굴에 소복이 자란 솜털도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다. 면도를 마친 뒤 족히 20년은 된 듯한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세수하면서 이발은 끝이 났다.
머리는 깔끔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연식이 있는(?) 머리 모양이었지만, 어디 가서 지저분하다는 소리는 들을 리 없는 멀끔한 모습이 됐다. 오래된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려면 스타일 면에서는 약간 양보가 필요하다. 취재원에게 실례가 되지 않을 깔끔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기에 만족한다.
계산을 마치고 이 씨는 기자에게 요구르트 한 병을 권했다. 저렴하고 작은 요구르트도 아닌 편의점에서 볼법한 큰 요구르트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 있을까. 이 씨는 기자의 질문에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어차피 살 만큼 살았어. 쌓아 둬봐야 뭐해. 이발비도 몇 년째 고정인지 모르겠어. 그저 오는 사람이 좋아서, 머리 자르기 위해 날 찾는 손님이 계시니까 계속 있는 거지”
이 씨를 보면서 1974년 발표된 윤오영의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이 생각났다. 소설 속 노인이 세월을 깎아 방망이를 만들 듯, 한민족의 격동기를 꿋꿋이 버텨온 한 노파는 세월을 깎아 머리를 만들고 있었다. 이곳, 새이용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