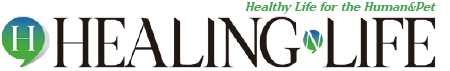삐------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
마치 스위치가 정지된 것처럼.
1970년생 환자 P는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하직하였다. 10분 전까지 나랑 대화했었는데...
환자의 입원 문의가 들어왔다. 병명은 자궁경부암. 벌써 수년째 투병중이었다.
소견서를 보면서 인적사항을 보니 1970년생이었다. 너무 젊어서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투병과정은 더 마음이 아픈 환자였다. 발병 당시 이미 전신 전이가 있었지만 남편은 백방으로 아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었다. 서울의 큰 병원은 다 가서 치료를 받았고, 보내준 자료만 해도 백과사전보다 두툼하였다.
남편은 아주 헌신적이었다 그리고 선량해 보였다. 아이는 고등학생.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정에 닥칠 불행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필자도 사람인지라 예의바르고 착한 사람들한테 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려서부터 아픈 엄마를 봐 왔을 아이도 얼핏 보면 구김 없이 밝은 얼굴이었다.
입원 당시 진통제 사용량은 일반적인 경우의 몇 배를 넘는 고용량이었다. 그래도 환자는 수시로 아프다며 울었다. 진짜 아파서 우는걸까, 슬퍼서 우는걸까 구별하기 어려운 흐느낌이었다. 마약 주사가 들어가도 10분도 안되어 또 울었다. 어떤 때는 약이 듣고 어떤 때는 약이 안 들었다. 아마도 몸이 아프기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또 몸이 아픈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 환자 P는 잘 웃었다. 아픔이 휘몰아치는 중간 중간 미소를 띄며 언제쯤 안아프겠냐고 나에게 묻곤 했다. 본인의 병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병원 와서 좀 덜 아파졌다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계속 아프다는 사람을 면담하는 것은 참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무언가 해줄 것이 남아 있다면 모를까 더 이상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에 맞딱뜨리면 필자 역시 지치곤 한다. 매일 아파요 하면서 울음을 더뜨리거나 언제 좋아지냐고 물어보던 P에게 할 말이 없어 그냥 겸연쩍게 웃고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수 주가 지난 어느 날 P가 하혈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상태가 안좋아지고 지혈제가 듣지 않아 남편에게 이전에 치료받던 대학병원으로 옮기는게 좋겠다고 하였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안그래도 얼마 전에 외래 진료를 보았는데, 진통제가 너무 쎄다면서 약을 줄이고,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P의 남편 역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다량의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무슨 일 있음 오라고 하면서 외래 진료를 마무리 지었다면 이렇게 서글프지는 않았을 거라 하였다. 그 역시 대학병원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 더 나빠지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찌 보면 인사치례일 수 있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해줄게 없으니 오지 말라는 말을 직접 듣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하였다.
P의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수혈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 없었다. 그러다 출혈 양이 줄어들고, 갑자기 아프다는 표현도 덜 하였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기운 없어 보이는 날이 많아졌다. 그렇게 1주일이 훨씬 더 지나서 어느날 저녁 평소 안 먹던 간식을 찾았다고 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간식이었다.
갑자기 사망하고, 연락을 받은 남편과 딸이 병원에 도착하였다. 아무리 각오하고 있던 이별이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시야가 흐려짐을 느끼며 임종실 문을 나섰다. P씨가 더 이상 고통없이 영면하기를 기원하면서...

관련기사
- “우리는 절대로 콧줄 안할거에요”
- 이번 여름, 마스크 없이 지내는 것은 가능할까?
- 요양병원에서의 밥 한끼
- 커피 한잔이 생각나는 하루
- 잘못된 수면습관 생활패턴 점검필수
- 치매로 쉽게 오인되는 ‘섬망’
- 요양병원, 코로나라는 주홍글씨 씌여진 순간
- 일본의 고령사회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2020년, 원더키디는 없었다
- 격리와 검역, 그 반복되는 역사와 코로나19
- 숨은그림 찾기같은 요양병원 인테리어
-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한 성인
-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최상의 진료 결과를 얻을 수 있어...
- 코로나바이러스, 이 또한 지나가리라.
- 공감(共感), 나와 타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
- 관심, 세상 만물에 대한 사랑의 시작.
- 치매가 걱정된다면 뇌를 운동시켜 주세요.
- 외로움, 그 자체로도 질병이다.
- 배우자가 치매인가요? 그럼 본인도 치매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 뇌물과 선물 사이
-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건강장수 가이드라인
- 잘 산다는 것을 넘어 잘 죽는다는 것은?
- 믿음이 주는 긍정적 효과
- 배려하는 마음을 물려받은 가족
- 비만은 질병, 2023년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 나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의사인가...
- 길었지만 갑작스런 이별
- 고맙다는 말 한마디의 위대함
-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 스승이 사라진 사회
- 최상의 치료가 언제나 최선의 치료일까?
- 장례식장에서 깨달은 인생사
- 나이들어가는 모두에 대한 오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