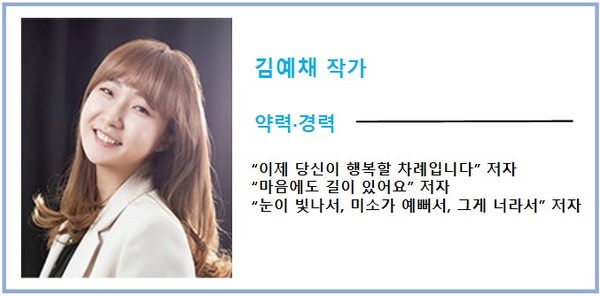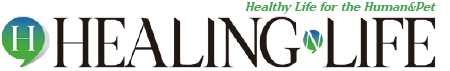김예채 작가
“이제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저자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저자
“눈이 빛나서, 미소가 예뻐서, 그게 너라서” 저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끼니를 챙기지 못해 잠시 작업실에서 나왔죠. 입맛도 없고 시간도 아낄 겸 샌드위치 하나와 커피를 들고 다시 작업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위해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이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를 건네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저를 위해 버튼을 눌러주신 분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파마를 하다가 잠시 나오셨는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점심 때가 한참이 지났는데 예쁜 처자가 밥을 먹어야지, 왜 빵을 먹어.”
어르신의 걱정에 괜히 뭉클했고, 찡긋 웃으며 가끔 이러는 거라 괜찮다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마치 제가 손녀라도 되는 듯이 타이르셨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러다 나이 들면 몸이 아파. 젊을 때는 든든한 밥심으로 사는 거는 거야. 잘 먹어야 힘들어도 이겨내고 버티지! 그래서 그깟 돈 얼마나 더 번다고.”
할머니는 그동안 살아온 연륜에서 얻은 지혜를 손자 같은 저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주셨죠.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한 마디인데 삭막하고 지쳐 있던 마음에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 한 마디의 위로가 지금의 지친 제 인생을 가만히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말았죠.
작업실에 돌아와 샌드위치와 커피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다시 나갈 채비를 했어요. 아까는 먹힐 것 같지 않던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따뜻한 밥을 먹고 돌아와 일해야겠더라고요.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의 짧은 시간 안에서도 사람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전화할 때마다 밥 먹었냐는 인사를 건네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죠.
또 다른 날이었어요.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 패턴에 지치기도 하고, 피구 공 피해다니 듯 사람들에게 치이고 사는 기분이 들었던 때였죠. 쓰고 있는 글은 생각보다 진전이 되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미 짜증은 오를 만큼 올랐고 몸도 찌뿌둥해서 도저히 작업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날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발걸음은 찜질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이럴 때 찜질방 한증막에서 숨이 막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땀도 흘리고, ‘찜질방표’ 냉커피를 쭈욱 들이켜며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날은 땀을 흘리고 커피를 마셔도 쉽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분이 더 가라앉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갈 힘도 없었는데 ‘세신 가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만사 귀찮은 마음에 세신을 예약하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 세신사님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앉아 있으니 누군가 저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전혀 세신사님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머리카락이 희끗하게 보이는 할머니는 제가 예약한 세신사님이 맞았습니다. 젊은 아주머니일 거라는 예상이 빗나가 당황하던 중에, 저는 이미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베드에 눕고 있었죠.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돈을 주고받는다지만 엄마보다 나이 많은 분에게 세신을 받자니 수천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인자한 웃음에 ‘홀려’ 저는 어느새 몸을 맡기고 있었고, 할머니는 저의 몸을 씻겨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았죠.
“나는 열일곱에 처음 명동에서 세신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래로는 동생이 다섯이나 있었지.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세신사로 일하면서 동생들 학비에 생활비까지 다 책임졌지요.
그러다 일본으로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가서 세신사 일을 했어요. 그렇게 다섯 동생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는 나긋나긋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께 물었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왜 아직도 일을 하세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이 나이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내가 아가씨 몸 주무르는 동안 세상 찌든 짜증 다 없어지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게요.
나도 그 시절 겪어봐서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뭘 해도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어요.
돈을 벌어도 매일 주머니 사정은 똑같고 쓸 곳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청춘은 다시 올 수 없잖아요.
청춘은 벼슬이에요. 그러니 크게 한 번 웃고 털어버려요.”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던 마음이 세신사 할머니의 위로에 사르르 녹아내려 버렸어요. 눈가가 시큰해졌죠. 할머니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떠오르는 잔상들 때문에 마음이 먹먹해져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는 과거였던 시간을, 돌아갈 수 없는 그 청춘을 살고 있구나.’
할머니 이야기가 저에게 ‘다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주는 듯했어요. 할머니는 울상을 한 청년의 모습이 안쓰러워 그냥 건넨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뜻밖의 위로 덕분에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한순간도 허투루 살 수 없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저의 위로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 스치듯 스쳐 갈 누군가에게 뜻밖의 위로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위 글은 에세이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에서 발췌 및 수정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