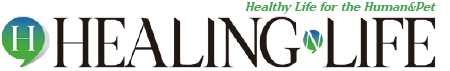펜더의 이름에 걸맞은, ‘클래스’ 입증할 신규 라인
빈티지한 손맛에 모던한 연주 편의성 더해

기자의 취미는 베이스 연주다. 영국인가 어느 나라가 중산층의 기준으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는가’를 묻는다고 했던가.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기자는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음악은 장비발이지!”를 외치면서 여러 비싼 악기를 이리저리 써왔다. 수년간 거친 브랜드만 따져도 손발로 모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국산 악기부터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독일, 폴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된 악기들이 기자의 손을 거쳤다. (물론 동시에 수십 대를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기자의 월급은 짜다.)
그중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포데라(Fodera)’를 들 수 있다. 미국 뉴욕시의 한 공방에서 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베이스 브랜드 중 하나로, 중고 시장에서 구해도 1000만 원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포데라는 이미 기자의 손을 떠났다. 결혼 이후에는 더는 장비를 지를 수 없다는 유부남 선배들의 피 같은 조언에 따라 큰맘을 먹고 중고로 구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서 차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어쩔 수 없이 포데라를 떠나보냈다.
의외로 포데라를 떠나보낼 때 망설임은 없었다. 사실 이 녀석은 요물이다. 살 때는 지갑과 손끝이 후들거리지만, 한번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가격이 이해가 되는 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나 이 악기를 들고 있으면 소위 ‘현자 타임’을 세게 얻어맞는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다. 내 실력에 이 악기를 쳐도 되는가. 어쩌면 다른 주인의 손에 갔더라면 정말 멋진 플레이를 자랑하는 명기가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력이 미천한 기자의 손에 잘못 들어가 가끔 뚱땅거리는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 악기를 주저 없이 판매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악기를 떠나보낸 뒤 남은 돈은 300만원 남짓, 여기서 기자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하기로 한다.
“새 악기를 사자!”
기자는 그동안 2009년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저렴한 일렉기타를 샀을 때를 제외하면 한 번도 새 악기를 산적이 없었다. 베이스를 시작한 이후에는 형편상 늘 중고 악기를 구매해왔다. 물론 중고로 1000만 원짜리 악기를 산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새 악기의 브랜드는 ‘펜더(Fender)’였다.
펜더는 1950년대부터 일렉기타와 베이스를 생산해온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악기 회사다. 클래식은 영원하다고 했던가. 누구나 떠올리는 일렉기타와 베이스의 모습을 정립한 회사이자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악가가 사용하는 악기다. 전자악기계의 ‘클래식’으로 볼 수 있다.
기자는 이중 가장 최근 출시한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베이스 V’를 선택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지막 남은 재고 1대를 ‘특가 찬스’로 건졌다.
최근 펜더의 미국산 양산 모델의 계보는 크게 ‘프로페셔널’과 ‘울트라’ ‘오리지널’의 3가지로 나뉜다. 이중 프로페셔널은 과거 스탠다드로 불리던 라인으로 가장 기본적인 악기다. 고급 악기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한다.
울트라와 오리지널은 성향이 정 반대다. 과거 디럭스와 엘리트로 불렸던 울트라는 잡음을 제거한 픽업(악기에서 수음을 담당하는 부품)을 사용하거나 넥 조인트(넥과 바디를 연결하는 부분)을 곡선 처리하는 등 연주의 편의성을 더하는 여러 현대적인 옵션이 들어간다.
반면 오리지널은 과거 빈티지로 불렸던 만큼 ‘빈티지’를 중심으로 한다. 과거 60~70년대의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잡음 등 당시 악기의 불편함까지도 재현했다.
기자의 경우 메탈의 철컹거리면서 낮게 깔리는 금속성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 소리를 왜곡하고 변형하는 이펙터를 강하게 쓰는 편이다. 잡음이 있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필자가 울트라를 선택한 이유다. 여기에 더 낮은 음을 표현하는 5현 옵션이 들어간 악기를 택하다 보니 선택지는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베이스 V로 좁아졌다.
악기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악기를 즐길 차례다. 하드케이스에서 악기를 꺼내 처음으로 마주했다.

마지막 1대가 남았던 만큼 색상에 대한 선택지는 없었다. 울트라버스트, 흔히들 선버스트(sunburst)라고 부르는 그 색상의 일종이다. 가장자리는 검고 안쪽은 약간 붉은 기가 있는 색상이다. 색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밝은 픽가드가 영 맘에 들지 않았다. 메탈 느낌을 내기 위해 검은색 픽가드를 제작해 새로 달았다.
감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악기를 찬찬히 살펴봤다. 연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옵션이 눈에 띄었다. 넥과 지판에서 낮은음 쪽과 높은음 쪽의 곡률을 다르게 만든 ‘컴파운드 래디우스’는 왼손 운지를 편하게 만들었다. 새로 개발한 ‘하이매스 브릿지’는 소리의 알맹이를 심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제는 사운드를 즐길 차례다. 울트라의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는 ‘펜더답다’라는 말로 압축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익숙하면서도 좋게 들리는 그 소리, 가장 펜더다운 소리. 하지면 여기에 연주의 편의성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디럭스나 엘리트 시절 펜더의 모던 성향 악기들은 호불호가 갈리는 악기였다. 음악계에서 흔히 말하는 가장 펜더다운 소리는 60~70년대 제작된 이른바 ‘올드 펜더’의 빈티지한 소리를 말한다. 실제로 잘 보존된 60년대 펜더의 경우 중고 시장에서 앞서 말했던 포데라 못지 않은 가격을 받는다.
그동안 디럭스나 엘리트 등 펜더의 모던 라인의 경우 펜더의 빈티지함을 표현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는 평이 많았다. 모던 라인에 호불호가 갈렸던 까닭이다.
하지만 울트라는 그동안 모던 라인 중 가장 펜더다운 소리를 표현한다. 새로 개발한 ‘울트라 노이즈리스 픽업’이 한몫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동안 선보였던 노이즈리스 픽업보다 이른바 ‘빈티지하다’고 불리는 손맛이 살아 있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산 새 베이스여서 그런지 현재까지 느낌은 아주 좋다. 물론 새 악기에 적응도 해야 하고, 합주도 거쳐봐야 한다. 합주를 통해 다른 악기와 합을 맞춰봐야 악기의 진정한 음향적인 특성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악기는 오랫동안 함께할 것 같다. 물론 결혼 이후 더는 장비를 사기 어려운 탓도 있다(아내를 사랑하지만, 잔소리는 무섭다). 악기 자체가 주는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모던과 빈티지 양쪽을 모두 잡은 다시 돌아온 클래식, 말 그대로 ‘울트라’ 다운 악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