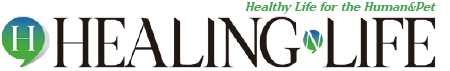최기자의 ‘남해 여행기’ 1탄, ‘장마’는 ‘남해’를 지울 수 없다
드라마에서 남해를 처음 인지했다. 2006년 MBC 드라마 ‘환상의커플’에서 한예슬과 오지호의 러브스토리는 푸른 바다와 햇살 가득한 곳에서 펼쳐진다. 드라마는 1년에 눈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남해였다. 나상실(한예슬)이 자장면을 먹기 위해 들렀던 중국 음식점과 장철수(오지호)의 ‘철수네 집’은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에 있었다.
정말 재밌었던 드라마였다. 눈이 오는 날 두 사람의 사랑이 이뤄진다는 뻔한 설정이었지만 남해는 아름다운 풍경과 설레는 사랑이 가득한 장소였다. 하지만 내 기억 속 남해는 환상의 커플에서 멈췄다. 서울에서 남해의 거리는 편도 약 500km. 왕복 1000km였다. 뚜벅이 대학생 신분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었다.
2020년 여름. 문득 휴가를 앞두고 “반드시 남해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인이 “남해 바다를 꼭 다녀와야 한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한 탓이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마음이 맞아 결국 남해를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휴가가 다가올수록 가슴 졸이는 시간이 이어졌다. 장마는 그칠줄 몰랐다. 매일 남해 날씨를 확인했지만 3주, 2주, 한주, 사흘 전까지도 남해 날씨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었다. 8월 6일 오전 9시 서울에서 남해로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벅찼다. 대전을 거쳐 통영을 지나 남해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넜을 때부터 남해 바다 내음이 평안을 가져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비록 흐린 날씨였지만 날씨가 그다지 아쉽지 않았다. 이미 남해를 제외한 모든 곳은 폭우가 쏟아지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가 적게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첫날 여행의 목적을 ‘맛집’으로 잡은 이유다. 날씨가 흐리면 어떤가, 푸른 바다와 하늘색 날씨만을 위해 여행을 다닐 수는 없다. 상황에 맞게 기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남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된다. 펜션에 도착하기 직전 남해 물회 맛집에 들어갔다.
인생의 대부분을 서울과 경기도에서 보낸 내가 물회를 맛본 것은 대구였다. 쟁반에 나란히 담겨 있어 기본적으로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먹는 것으로 회를 정의 내려왔다. 하지만 3년 전 대구 출장을 갔을 때 물회를 처음 접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물과 회를 같이 먹는다. 게다가 초장을 찍어먹을 필요가 없어 간편했다. 그날 대구 날씨는 38도, 경찰서 취재를 위해 거리를 전전하다 물회를 먹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
남해의 물회도 기대 이상이었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부드러운 광어 뱃살이 입으로 술술 넘어갔다. 바닷가 근처에서 먹어서 그런지 꿀맛이었다. 물회의 백미는 남은 국물에 면을 말아먹는 것이다. 둥글게 돌돌말린 소면을 물회에 넣어 먹고 감탄했다.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물회는 “여행에 날씨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냐”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좋은 날씨’라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인간 입장이었다. 남해에 비바람이 불면 여행으로 사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더없이 아쉬운 일이지만 남해에게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일 수 있다.
오히려 인간들이 남긴 불순물들이 한꺼번에 씻기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어 남해 입장에서는 비 내리는 날씨를 더욱 환영할만하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흐리면 인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여행지에서 내리는 비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물회를 먹고 바다를 향했다. 남해는 곳곳에 백사장이 있었다. 어딜가든 부산의 해운대만큼 넓지 않았지만 해운대의 3분의 1 크기의 백사장이 보였다. 코로나와 장마가 겹친 탓인지 해수욕장마다 모인 사람들은 20명 정도였다. 아담하고 아늑했다. 바다 속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부드러운 모래가 둔탁한 발 표현을 감싸면서 포근했다.
발은 손보다 더럽다. 주기적으로 손을 씻지만 발은 직장에 다녀온 후 겨우 씻을 정도다. 손냄새라는 단어는 없지만 발냄새라는 단어는 있다.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신체 곳곳을 씻어도 발을 씻지 않으면 강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바닷가에 발을 담그는 행위는 단순히 시원함을 느끼는 것에서 머물지 않는다.

고된 노동의 끝에 고생한 발이 푸근한 바다 품으로 안기는 것이다. 고운 모래가 열심의 노동으로 얼룩진 발 표면을 감싸고 바다의 향으로 발을 씻기는 행위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을 바다에서 보내기 위해 처음으로 하는 선택지 역시 신발을 발에서 벗는 행위도 바다를 통해서라도 마지막 위로를 느끼고 싶어하는 외침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바다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고 파도가 발등에 부딪칠 때마다 개운했다. 평화롭고 시원했다. 황토색 빛깔의 바다이기 때문에 저 멀리 멋진 광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나의 시선 밖의 일이이었다. 모래와 파도 그리고 바다가 발에 주는 위로는 노동의 시간들을 완전히 떨쳐내게 만들었다.
펜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남해에 있는 맘스터치에서 치킨을 사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골라 펜션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마치고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컵라면을 함께 먹으면서 몸을 데웠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밤늦게까지 고스톱을 치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테라스 밖의 바다를 보며 잠이 들었다. 남해의 첫째날 여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