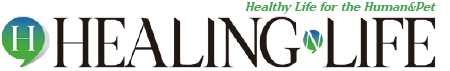강화도를 ‘갈매기’로 규정 짓지 말라…강화도가 통곡할 일이다

갈매기가 새우깡이 들려진 사람의 손으로 날아들어 새우깡을 낚아채는 모습. 수십마리의 갈매기가 떼지어 바다위를 넘실거리며 흙빛 바다 위를 거니는 장면. 그만큼 갈매기 체험은 강화도 여행의 필수 코스다. 특히 가족 단위로 강화도를 찾은 이들은 강화도 옆 석모도를 향하는 배 위에서도 갈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는 강화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클리셰(cliché)다. 클리셰(cliché)는 프랑스어로 인쇄에서 사용하는 연판을 뜻한다. 갈매기로 강화도를 규정짓는 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여행의 모습이라는 얘기다. 강화도 여행의 또 다른 클리셰는 서해의 갯벌이다. 강화도에 가면 흐린 하늘과 흙탕물의 갯벌을 봐야 한다는 ‘클리셰’다.
여행은 본질적으로 ‘클리셰’를 거부한다. 여행이 클리셰로 물드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 파리를 가면 에펠탑을 봐야 하고 부산에 가면 해운대 바다를 떠올리는 것. 일상의 클리셰를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꿈꾸다가 막상 다녀오면 뭔가 진한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화도를 갈매기로 규정하는 클리셰는 강화도가 통곡할 일이다. 강화도를 서해의 갯벌로 치부하는 관념도 강화도가 대노할 일이다. 강화도를 육지와 이어진 단순한 섬으로, 인천이라는 거대 도시의 부속섬으로 경히 여기는 것 자체는 강화도를 서럽게 만드는 생각이다. 오히려 우리는 강화도 여행을 계획할 때 갯벌과 갈매기를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럼, 강화도 어디를 가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힐링 독자들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조양방직’이다. 조양방직은 강화도에 있는 폐공장을 개조한 카페다. 조양방직 주차장에 도착하면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얼룩진 벽이 먼저 보인다. 입구도 정확히 찾을 수 없을 만큼 아득한 곳에 있지만 조양방직에 들어가면 ‘빈티지’가 ‘클리셰’를 압도하는 모습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는 진부하기 그지없는 운송수단이다. 여행이 아닌 출퇴근길의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스치는 모든 것이 클리셰인 이유다. 그러나 역사와 체험이 함께한 빈티지는 익숙한 버스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조양방직 입구에 놓여 있는 낡은 버스 한 대는 강화도 여행의 시작을 색다르게 장식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다. 이곳의 빈티지가 주는 특별한 감동은 ‘시선 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버스를 탈 때 우리의 시선은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좌석을 향한다.
하지만 조양방직의 낡은 버스 안에서 우리는 기사석에 앉아 드넓은 창문이 선사하는 시야를 느끼며 거대한 핸들을 돌려볼 수 있다.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고 기어조작대를 이리저리 휘두를 때마다 기분 좋은 웃음이 터져 나온다.

버스를 지나면 폐공장 건물이 등장한다. 이곳에서는 이리저리 널부러져 있는 청소도구부터 벽장시계 그리고 캐비닛, 의자와 쇼파는 물론 심지어 수레도 볼 수 있다. 이 모든 사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낡고 사람의 손과 때가 탔다는 것이다. 거뭇거뭇한 때들이 모인 빈티지는 클리셰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조양방직 방문객들이 빈티지의 아름다움으로 기억하면서 연신 셔터를 눌러대고 있는 이유다. 빈티지를 향한 시선이동은 이렇게 클리셰를 부수고 감동을 만들어낸다.